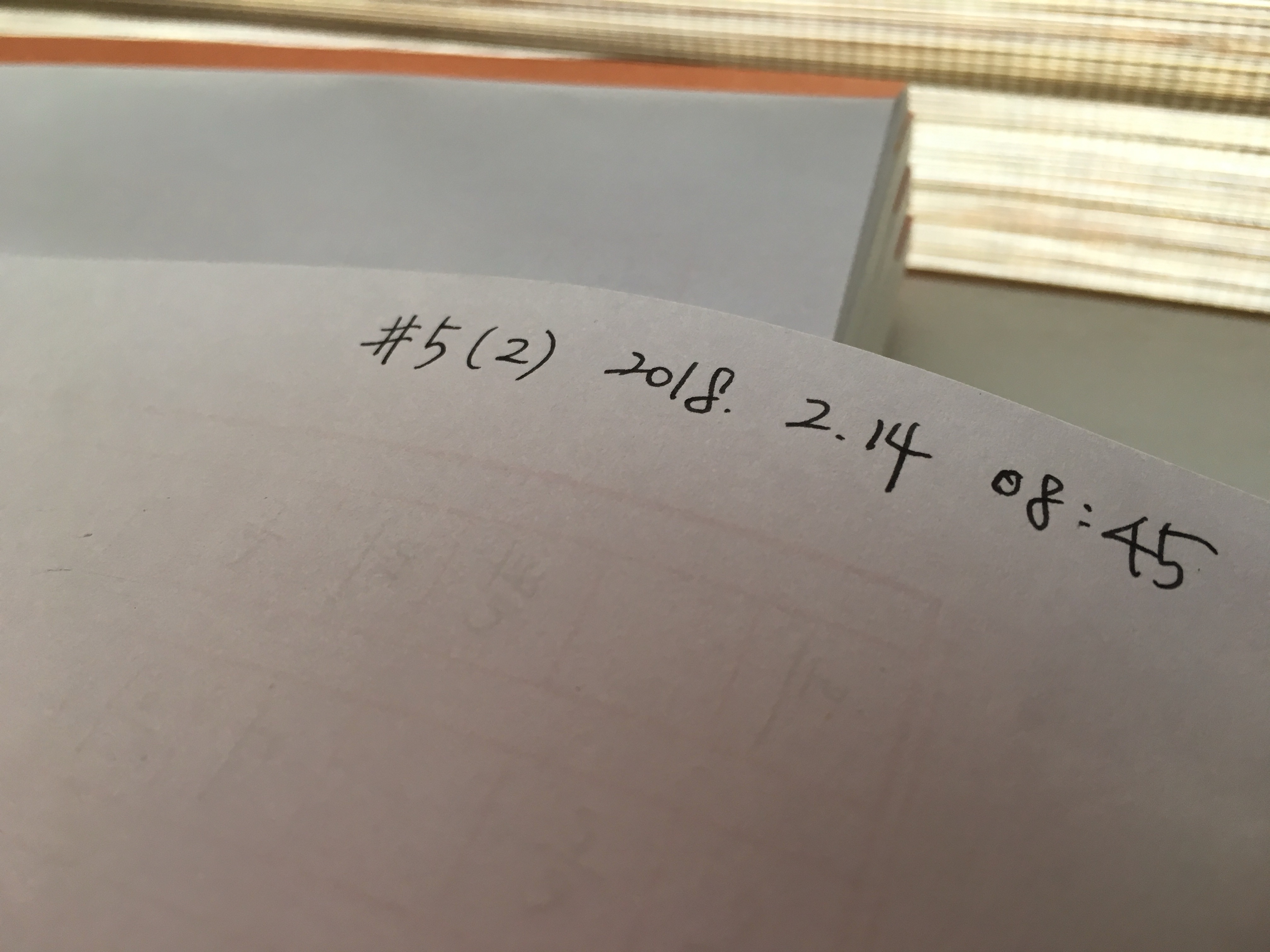만년필로 쓰는 재미가 좋다.
만년필을 처음 접한 것은 아마 중학교 입학 선물로 아부지께서 사주신 만년필이었을 것이다. 아마 파커였던 것 같은데 너무 굵게 써지고 주변에 만년필을 쓰는 친구는 하나도 볼 수가 없어 나도 쓰지 않았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할 수가 없다. 본가 창고방 어딘가에서 수십년을 잠자고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2008년 회사에서 e-learning 부교재로 준 프랭클린 플래너를 쓰면서 그때 만년필을 쓰기 시작했다. (e-learning을 하니 프랭클린 플래너를 준게 아니고, 프랭클린 플래너를 받기 위해 해당 e-learning을 신청했다.) 그때도 만년필을 산 것은 아니고 아내가 쓰던 만년필을 받아서 써보았다. 그때 잉크를 한 병 샀는데 아직도 쓰고 있다. 이제 한 1/10 정도 남아있다.
프랭클린 플래너 속지는 만년필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 글씨가 번지고 칸이 작아서 만년필 보다는 세필 볼펜이 더 잘 어울린다.
약 5년 전에 라미 만년필을 싸게 사서 회사 업무 노트 필기에 사용했다.
아내가 쓰던 만년필과 라미 만년필은 뭔가 불만족스러움이 있었다. 글씨를 잘 쓰고 싶은데, 글씨를 쓰면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고 싶은데 이 펜들로는 뭔가 맞지 않았다. 훌륭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고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고 펜을 탓하고 있다.
그래도 한동안 잘 썼고 라미는 모서리도 깨지는 등 세월의 흔적을 간직해갔다.
그러다가 이번에 필사를 하며 큰마음 먹고 펠리칸 만년필을 또 구입했다. 어리석은데 어쩌겠는데 이러는데 중생이지…

필사는 이 세 만년필을 번갈아가면서 즐거이 하고 있다. 만년필마다 굵기와 모양과 잡는 느낌과 종이를 지나는 느낌과 글씨의 굵기와 색의 진함이 다르다.
펠리칸에는 잉크를 넣어서 쓰고 있고, 아내의 만년필과 라미에는 잉크를 넣지 않고 그냥 잉크를 묻혀서 쓰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다.
원고지도 종류에 따라 당연히 값도 다르고 쓰는 느낌도, 잉크의 번짐도, 굵기도 다르다.
‘필사’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무궁한 재미를 주는 취미를 찾아서 즐겁다.